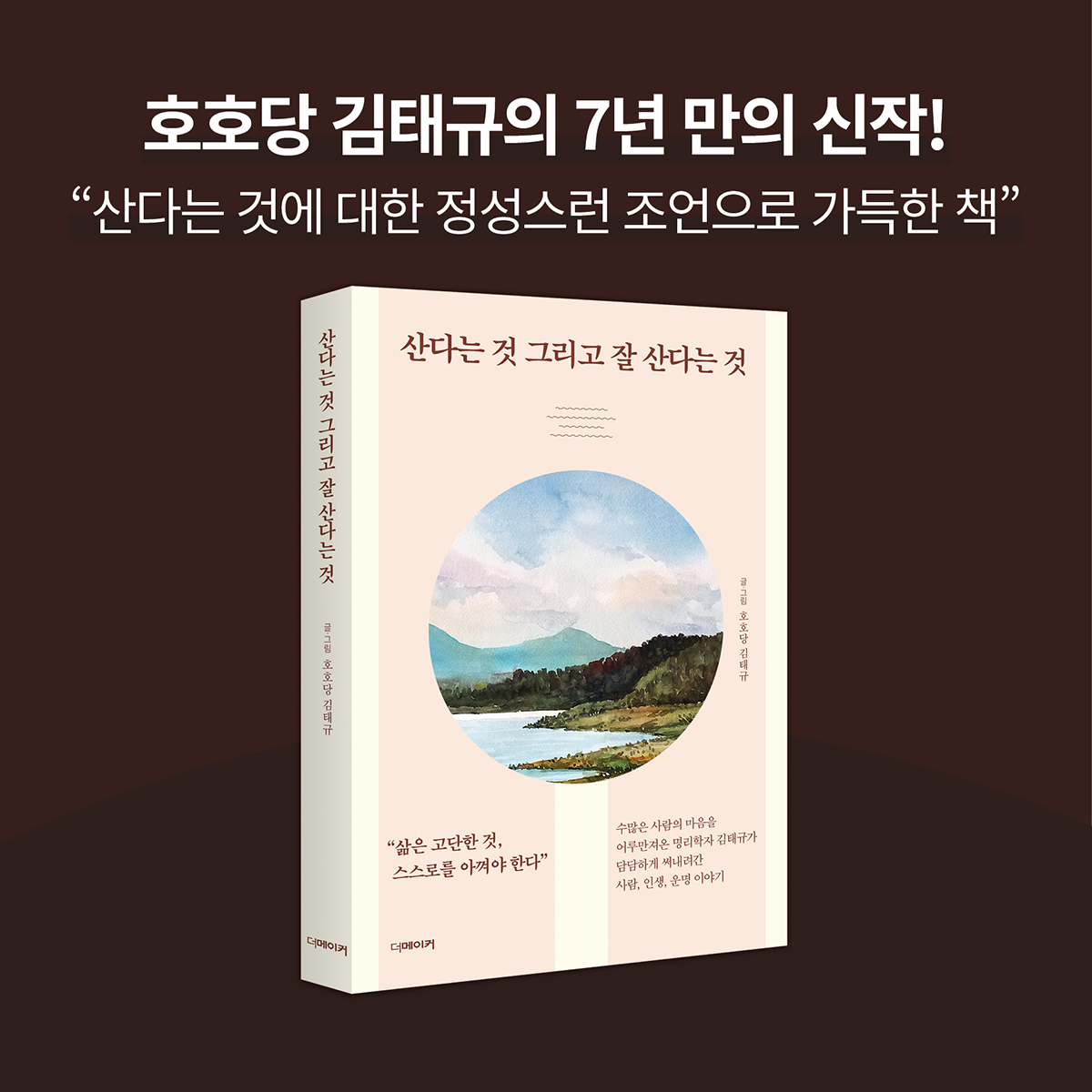어쩌면 우주 자체가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의 우주 즉 유니버스(universe)가 빅뱅으로 해서 생겨났다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다양한 데 그 중에 하나로서 어쩌면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다. 멀티버스(Multiverse) 가설이 그것이다. 평행우주란 말도 있는데 이 역시 우주가 중중무진일 때 가능한 얘기이다.
어차피 현재로선 빅뱅 이론이든 다른 주장이든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론이야말로 맘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담론의 영역이란 점에서 멀티버스 가설도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21년까지만 해도 우주란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은하란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면서 우주는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은하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특히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허블 망원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멀고 먼 우주 저편의 은하들로부터 날아온 빛들을 사진으로 찍어내고 있다. 이에 천문학자들은 오늘날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2조 개나 되며 은하 속의 별은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도 더 많다고 보고 있다.
멀티버스는 아주 오래 전 인도에서 이미 제시되었으니
그런데 이 대목에서 돌이켜보면 멀티버스라든가 평행우주와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사실 대단히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힌두철학 내지는 불교철학의 우주론이 바로 그것인데 그 시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우리에게도 친근한 불교의 세계관이자 우주론인 三千大天世界(삼천대천세계)가 그렇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멀티버스 혹은 평행우주란 점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고대 인도 사람들의 생각부터 알아보자.
위치값 기수법을 발명해낸 힌두인들
고대 인도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십진법 체계를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원후 400년 무렵엔 ‘0’이란 숫자를 발명함으로써 숫자를 표시함에 있어 그야말로 위대한 혁신인 “위치값 기수법”을 창안했다.
Positional notation!
이게 생소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가령 320,671이란 숫자를 생각해보자. 이 숫자 안의 ‘0’은 천 단위에 붙는 숫자란 점이다. 즉 숫자의 위치에 따라서 수의 크기를 우리 모두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숫자를 한자 기수법으로 표시하면 三十二萬六百七十一이 된다. 얼마나 불편한가!
거기에 이런 식의 기수법으로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려면 그야말로 골 때린다. 더 골 때리는 건 로마식 기수법으로 곱셈이나 뺄셈을 하려면 일반인은 아예 불가능하다. 가령 6천명의 군단이 석달 동안 작전하기 위해 보급해야 할 식량을 계산한다고 해보자. 하루 세 끼, 3달간 보급, 필요한 물자는 밀과 우유, 버터, 치즈라 한다면 그 계산만으로도 하루의 시간으론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흔히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진 힌두(고대 인도)식 위치값 기수법이 발명되었기에 힌두인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상상해내고 만들어내고 자유자재로 계산해낼 수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 역시 그런 기수법 때문에 개념화될 수 있었다.
우주 속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계란 것이 오늘날 와서 보니 우리 은하계 속의 무수히 많은 별 중에서 그저 그런 별인 태양, 그리고 태양이 거느린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에 불과한 여러 행성들 중에 하나인 行星(행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 중에 생명체가 사는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밖에 없다. 혹시라도 화성 지하에 미세한 유기체 또는 생명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에서 이 시각에도 미국이 보낸 로봇이 화성 표면을 삐그덕-대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우주 안에 존재할 확률을 수천 兆(조)분의 1로 추정하고 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되는 희박한 확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지구 밖에 또 있을 거란 점에 대해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것은 나름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
앞에서처럼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은하계만도 2조개나 되고 별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다고 하니 별에 속한 행성은 더더욱 많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행성의 숫자가 거의 무한대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 또한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봄직도 한 것이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멀티버스
그러면 이제 三千大天世界(삼천대천세계)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할 때가 되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를 그냥 하나의 세계라 하면 그것이 천 개 모인 세계를 小天(소천)세계라 하고 또 그것이 천 개 모인 세계를 中天(중천)세계, 다시 그것이 천 개 모인 세계를 大天(대천) 세계라 한다.
천 배씩 세 번 곱한다고 해서 三千(삼천), 즉 三千大天世界(삼천대천세계)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구와 같은 행성이 전체해서 10억 개가 있는 세계인 셈인데 부처님은 바로 이 대천세계를 하나의 교화영역으로 한다고 인도 불교의 초기철학이론서인 “아비달바구사론”에 적혀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선 부처님 또한 무수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삼천대천세계 역시 무수히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그게 바로 멀티버스이고 동시에 평행우주론이 되기도 한다.
힌두사상, 인류 최고의 환타지
고대의 인도 즉 힌두 사상과 불교철학을 접해보면 그 스케일과 깊이에서 사람을 혹하게 만든다. 기존의 그 어떤 환타지보다 더 뛰어난 환타지가 아닌가 싶다.
최근 들어 다양한 우주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의 멀티버스라든가 평행우주만이 아니라 초끈이론이란 것도 제법 자주 귓전에 들려온다.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론이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지 않는 바람에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모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로선 그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에 관한 과학교양서들이 적지 않지만 글이 아니라 수학 또는 數式(수식)으로 제시된 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 한 그건 이해한 것이 아닌 까닭이다.
불교에선 하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欲界(욕계)를 포함해서 色界(색계), 無色界(무색계)로 이루어진 33天(천)의 수직적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시공간에선 도무지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혹시나 초끈이론이 말하는 11차원의 세계가 바로 그런 구조를 허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만 초끈이론은 물리학자들의 아이디어일 뿐이지 검증할 길이 전혀 없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상상은 변함이 없고 또 기발하다.
'호호당의 雜學잡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봄비 흠뻑 내리니 좋아서. (0) | 2021.04.03 |
|---|---|
| 치과 시술대에 누워 (0) | 2021.03.23 |
| 저 세상이 있었으면 해! (0) | 2021.03.08 |
|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며 천천히 거닐었으니 (0) | 2021.02.28 |
| 가족의 해체와 사회안전망 (종결편)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