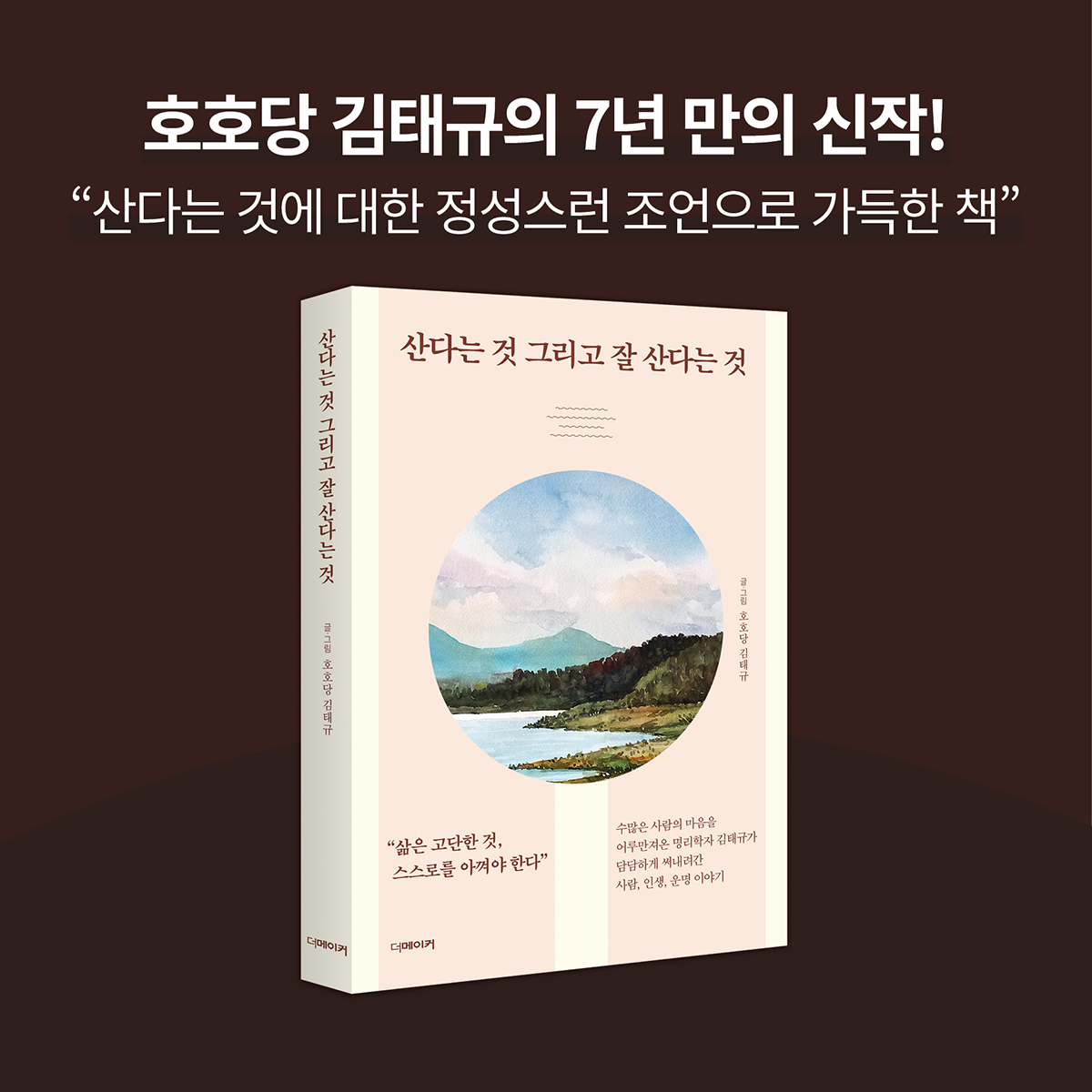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래에 대해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살고 있다. 거의 예외가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
중년의 가장들은 직장에서 언제 잘릴 지 걱정이고 이에 혹시 그만 두고 나면 뭐를 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해 내심 많은 걱정을 한다. 그만 두고 나면 받아줄 곳이 없으니 선택지는 자영업이다.
자영업의 경우 최근엔 취업에 실패한 젊은 청년들도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7% 정도로서 대단히 높은 편이다. OECD 평균은 15.4%이고 좀 괜찮다 싶은 나라들은 대부분 10% 초반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말은 경제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자영업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 정도이다. 모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다, 네 나라 모두 경제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인 나라들이다.
청년들은 학교를 마친 뒤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대단히 낮다. 청년 실업률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 개선될 조짐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나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래봐야 마흔 중반까지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이죠 뭐’ 하는 얘기를 예사로 듣게 된다.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청년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어쩔 수 없이 창업하게 되는 청년들도 상당수이고 대부분 3년 안에 실직자가 된다.
50대 후반을 넘긴 장년층들 역시 걱정이 태산이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서른이 넘은 자녀를 여전히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노후 대책 역시 부실하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독거노인이 되어 쪽방에서 죽어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은근히 하며 지낸다.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해 청년들과 얘기해보면 몇 년 사이에 아예 풍조가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나 호호당이 만나본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최근 들어 꼭 결혼하겠다는 젊은이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으나 과연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말이지 60대인 나로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싶다.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도 예전에 비해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론 돈 그리고 수입의 문제라 여겨진다. 결혼을 하지 못하니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출산율이 저 모양일 수밖에.
(참고로 얘기하면 유교적인 통념이 강한 우리 사회인 탓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은 것에 반해서 그렇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오늘에 이르러 결혼 제도 자체가 붕괴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國運(국운)의 겨울, 불임의 시대
가히 우리 대한민국의 國運(국운)이 한 겨울에 들어섰음이 분명하다. 겨울은 生産(생산)의 계절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지금 우리는 不姙(불임)의 때를 보내고 있음이 확실하다.
청년층은 아니지만 내가 만나는 대다수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올 만큼 온 것 같다, 앞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내려갈 공산이 더 큰 것 같다, 현 위치라도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이란 말을 흔히 한다.
행복하지 않은 2018년의 우리 사회, 원인은?
선뜻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들 녀석은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하는 기술이 나 호호당보다 훨씬 뛰어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온 세상을 들쑤시고 돌아다닌다.
얼마 전 아들에게 우리 사회가 많이 불행해진 것 같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아빠, OECD Better Life Index 란 게 있어,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어” 하는 것이었다.
아, 그래? 하고 즉각 구글로 검색했다.
OECD Better Life Index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나름 일리가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OECD 국가는 현재 38개국이다. 11개 항목에 대한 지표가 있고 나라별 순위가 표시되어 있었다.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이른바 워라벨)이었다.
대다수 항목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거나 뒤처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뒤처지는 항목들이 3개 눈에 띄었다.
환경 지표에서 우리가 38개국 중에서 36등이었고, 워라벨이 35등이었다. 환경이 나쁘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 뜻밖이었다. 환경 항목은 수질과 공기오염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기오염도가 38개국 중 꼴찌였다.
이런? 했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래, 우리가 중국 옆에 붙어 있다 보니 어쩔 수가 없구나 싶었다. (참고로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다.)
워라벨이 열악하다, 뭐 이건 당연히 인정한다. 지금 정부가 주52시간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공직이나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실은 무진장 열악한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면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는 직장이 허다하다.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특히 그렇다고 아들이 일러주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우울하고 사생활이 없다는 말을 들을 법도 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항목이 하나 있다는 사실. 이제 공개하겠다.
바로 공동체(community) 항목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공동체라서 38개국 중에서 꼴찌 하는가 싶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공동체란 항목 지표는 ‘Quality Of support network’이라 되어있다. 그래서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해서 읽어보았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원문을 옮겨본다.
Percentage of people who believe they can rely on their friends in case of need.
우리말로 옮기면 ‘필요시 친구나 친지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백분율’이다.
인정이 메말라버린 2018년의 대한민국
바로 이 대목이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다. 처음엔 선뜻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에겐 오래 전부터 유교적 풍조로 인해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있어왔건만 아니 이게 꼴찌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75.9%로서 꼴찌였다.
1위 국가는 아이슬란드(Iceland)로서 98.3%였다. 하기야 그 나라는 인구가 겨우 32만에 고립된 섬나라이다 보니 사실상 모두가 친족 관계인 나라이다. 그러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싶다. 그런 작은 나라가 이번 월드컵 본선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전 국민이 남이 아니라 형제라서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다 싶었던 바로 그 나라 말이다.
중간에 위치한 수치를 눈짐작으로 보니 90%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는 75.9%였다. 이 정도면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인구인 우리나라인데 그 중 1250만 명이 유사시 의지할 데가 없다는 말이 되니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어느새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되고 만 셈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인심이 사나운 나라 대한민국인 것이다.
며칠 생각을 해보았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처럼 건조하고 강팍한 사회가 되었지? 하는 질문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우리나라는 대단히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고향을 떠나 오로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실상 친척이나 친지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으로 남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아직도 열심히 고향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사실 이는 정이 있어서라기보다 체면과 눈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가 많은 것 역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또 하나 드는 생각으론 우리가 그간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에 대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여기고 배척해온 결과 결과 지나치게 緣(연)을 끊으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촌이라 하면 사실 가까운 사이이지만 1년에 한 번 보기 어렵고 조카라 하면 명절 때나 얼굴 한 번 보는 정도로 우리 사회의 끈이 허약해진 것이 사실 아닌가. 그러니 유사시 의지할 데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한편으로 서양의 개인주의 성향을 우리가 무조건 추종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사회안전망 확충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에 툭 하면 사회안전망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워지면 믿을 놈은 나 자신밖에 없다 한다면 우리 모두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인가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6.25 전쟁 이후 나라를 건설해오는 과정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오늘은 8.15 광복절 새벽이다. 나 호호당은 이 시각 오전 4시 30분까지 그림을 한 장 그리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다. 2018년의 대한민국은 행복하지가 않다.
'자연순환운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신의 삶이 역경에 처했을 때 #2(최종편) (0) | 2018.08.19 |
|---|---|
| 당신의 삶이 逆境(역경)에 처했을 때 #1 (0) | 2018.08.18 |
| 터키, 민중독재가 걸어가는 길 (0) | 2018.08.13 |
| 2018년의 반환점인 立秋(입추)를 앞두고 (0) | 2018.08.06 |
| 굽이굽이 걸어온 호호당의 탐구 여정 (제1회) (0) | 201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