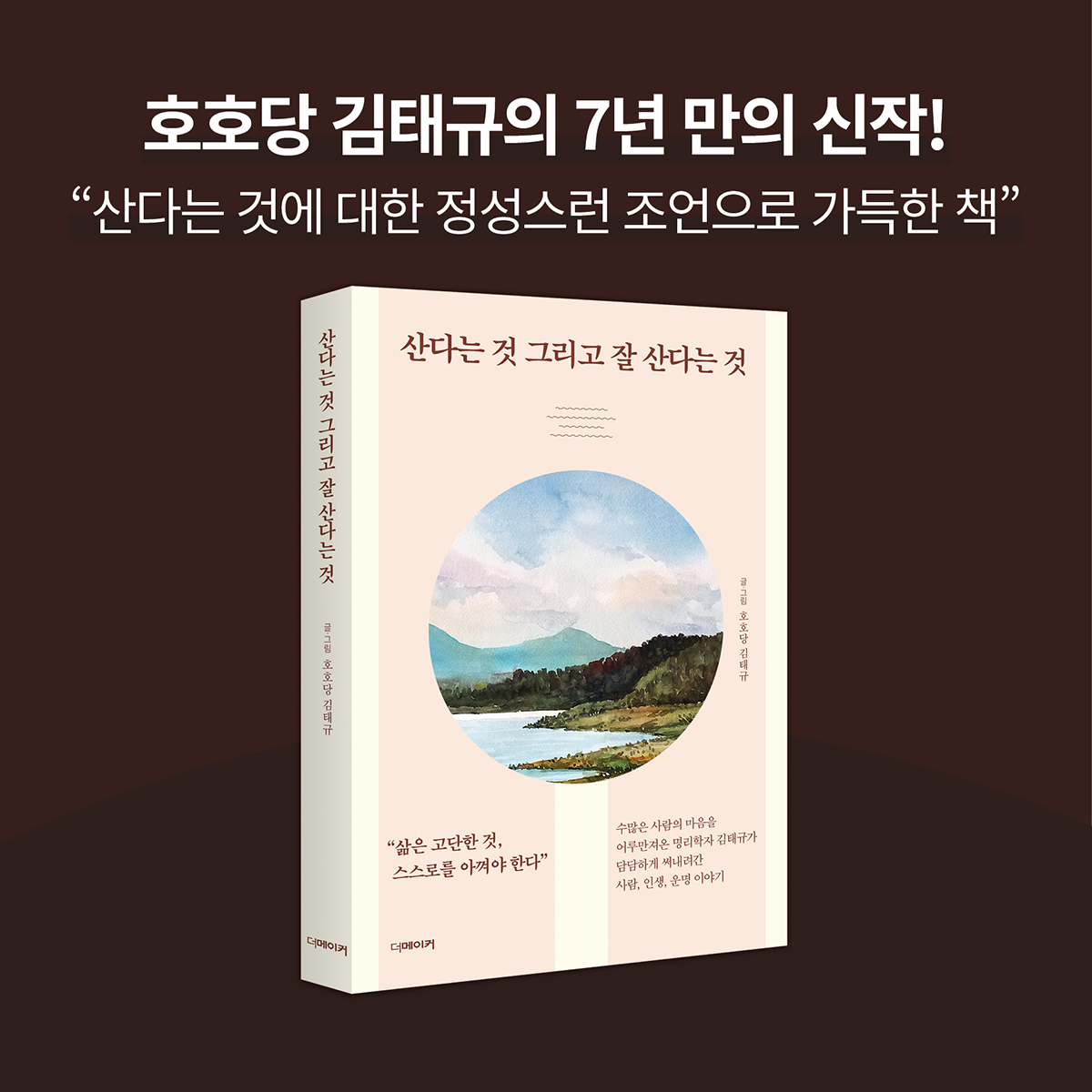호랑이 네 마리가 어흥! 하는 날
壬寅(임인)년 壬寅(임인)월 壬寅(임인)일 壬寅(임인)시.
이는 어제, 2022년 2월 18일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의 두 시간 동안을 육십갑자로 표현한 것이다.
壬寅(임인)의 해가 60년에 한 번 돌아오니 60년 전에도 네 개의 干支(간지)가 모두 壬寅(임인)인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어제 새벽처럼 壬寅(임인)이 네 번 거듭되는 때를 거슬러 살펴보니 1782년 2월 16일 새벽이었음을 확인했다. 어제처럼 壬寅(임인)이란 간지 네 개가 모두 같은 때는 무려 240년만의 일이다.
육십갑자로 표기하는 방법은 결국 60進法(진법)이다. 10진법을 쓰고 있는 우리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 표기방법 즉 記數法(기수법)이다. 그런데 어제와 같이 연월일시가 모두 壬寅(임인)인 표기는 60년마다 등장하지 않는다. 60 곱하기 6은 360인데 1년은 대충 365.2425일이어서 세월이 지나면 어긋나기 마련인 까닭이다.
그렇기에 어제 새벽, 즉 壬寅(임인)년 壬寅(임인)월 壬寅(임인)일 壬寅(임인)시는 나름 특별한 날이었다. 그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분명 있었을 것인데 그 아이는 분명 상당히 강한 개성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며칠 전부터 카운트해왔다, 어제 새벽이 그런 때란 것을.
사인검이란 신령한 물건
이에 四寅劍(사인검)이란 물건을 소개한다. 寅(인)년 寅(인)월 寅(인)일 寅(인)시에 칼날을 담금질해서 만들어내는 검을 뜻한다. 천간과 지지 모두 같을 필요는 없기에 12년마다 한 번씩 만들 수 있다. 모든 猛獸(맹수)의 으뜸인 호랑이의 기운을 그것도 네 마리씩이나 칼에 담아낸다는 의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사인검은 조선조 중기에 왕들이 장식용 또는 호신용으로 지녔던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참 빈약하다. 장식용도 아니고 호신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 호호당은 사인검을 두 번 구경했다.
오래 전, 그러니까 1974년 고려대학교 입학식 날, 3월 5일이었을 것이다. 입학식 전에 시간이 있어서 잠시 교정을 돌아보다가 우연히 박물관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인검을 만났다. 첫눈에도 너무나도 멋진 검이었다. 날이 서 있지 않아서 실전용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의 물건이란 생각을 했다.
칼자루는 상감 처리되어 있고 칼날은 銀入絲(은입사) 기술로 한 쪽엔 북두칠성과 二十八宿(이십팔수)의 별자리, 반대편 칼날엔 篆書(전서)로 글이 새겨져 있었다. (나중에 그게 27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너무나도 멋져서 정말이지 훔쳐오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神靈(신령)한 물건이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웠다. 뒤돌아 나오면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저 그 날 초봄의 찌푸린 잿빛 하늘 아래 볼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기억이 난다.
훗날 용산 군사박물관에서 또 한 자루의 사인검을 만났는데 그 때 비로소 새겨진 글자가 모두 27자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잘 알지 못하는 篆書(전서)로 새겨져 있어 정확하게 읽어낼 순 없었고 나중에 사인검에 관한 자료를 통해 그 글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乾(건) 즉 하늘이 精氣(정기)를 내리고 坤(곤) 즉 땅이 神靈(신령)함을 도우니 日月(일월), 해와 달이 象(상), 모습을 갖추고 岡(강)과 澶(전), 즉 산과 강이 이루어지며 雷電(뇌전), 천둥번개를 몰아친다.
玄坐(현좌), 즉 북방의 신령한 기운을 움직여 산의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현묘한 이치로서 베어내어 바르게 하라.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다소 애매해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엄청난 문장이니 감히 임금 정도의 지위에서나 쓸 수 있는 엄청난 기원이고 주문을 담은 사인검이라 하겠는데 그 용도는 도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왕권을 수호하는 일종의 신령한 符籍(부적)이라 하겠다. 그러니 그냥 호사를 위한 장식용도 아니요 날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 호신용 또한 아닌 물건이다.
도교의 영향도 실로 컸던 우리 사회
조선 시대는 유교가 국교였던 탓에 임금들이 사인검을 만들어 지니는 것에 대해 수시로 신하들이 반대했다는 기록도 보았다.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에 임금들도 유교 신하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인지 제작비를 國庫(국고)가 아니라 왕실의 私費(사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조선시대가 공식적으론 儒敎(유교)의 시대이긴 했으나 북두칠성을 의인화한 칠성신앙이나 별자리 신앙, 옥황상제 등등의 도교 신앙과 불교 또한 절대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왕은 사인검이란 칼을 만들어 부적으로 지녔고 왕에겐 부적용 칼을 만들지 말라고 하던 사대부와 양반들 역시 한 뼘 크기의 작은 칼 즉 粧刀(장도)에 이런저런 문양을 새겨서 일종의 부적으로 삼아 패용했던 것이다. (장도는 호신용으로 쓰기엔 어림도 없는 물건이다.)
칠성검의 뜻을 알면 그야말로 환타지!
참고로 얘기하면 도교의 도사들이 사용하는 검을 七星劍(칠성검)이라 부른다. 칼날의 한쪽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는 검인데 그 의미를 살피면 참으로 흥미롭다. 북반구의 밤하늘은 기본적으로 북극성을 꼭짓점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그 북극성을 도교에선 玄天大帝(현천대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 현천대제가 휘두르는 검이 바로 북두칠성, 즉 칠성검이란 식이다. 현천대제 북극성이 시계방향으로 밤하늘을 크게 휘두르고 있는 칼이 북두칠성이니 얼마나 환타지인가!
그런가 하면 도교의 道士(도사)들이 쓰는 칼은 소나무 문양 즉 松紋(송문)이 새겨져 있는 검도 많은데, 주윤발과 장쯔이가 주연으로 나오는 “와호장룡”이란 무협영화 속의 명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로부터 민간에선 복숭아 나뭇가지가 악귀를 쫓는다 해서 복숭아 가지로 만든 목검, 일러서 桃符劍(도부검)도 무당들이 흔히 지녔었다. (나 호호당도 예전에 산에서 도 닦는 분이 한 자루 주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이처럼 칼이란 예로부터 몸을 지키는 대표적인 물건이었고 이에 여러 기원과 주문을 담은 부적용 칼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寅(인)은 陽氣(양기)의 출발점, 그리고 雨水(우수)
이처럼 옛 사람들은 十二支(십이지) 중에서 寅(인)을 양의 시작점, 陽氣(양기)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때로 보았고 이에 寅月(인월)의 첫날인 立春(입춘)을 한 해의 첫날로 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치를 잘 살필 것 같으면 寅月(인월) 중에서 진정으로 양기가 살아나서 동하는 첫날은 바로 오늘 2월19일 雨水(우수)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새벽 1시 43분으로서 우수를 맞이했다.
雨水(우수), 비 雨(우)에 물 水(수)인데 마침 오늘 오후 서울 지역엔 눈발이 날렸다. 우수로부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봄의 첫날인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조금은 엇나간 셈이다.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우수는 고대 로마 사회에선 집안 청소를 하는 날, 즉 淨化(정화)의 날,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물청소의 날을 의미하는 February 와 그 뜻이 같다. 양력 2월이 되면 정화작업 즉 청소를 했던 것이다. (February는 정화의 달이다.)
청소, 한 해를 잘 꾸려가기위한 준비
한 해를 잘 꾸려가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하려면 우선 몸과 마음을 잘 씻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주변 환경 역시 말끔하게 청소해야만 뭔가 힘찬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정화 의식인 February 와 24 절기의 雨水(우수)는 본질에 있어 의미가 같다. 왜 그럴까? 하면 다 같은 인간인 까닭이다. 기울어진 지구가 태양을 돌다 보니 계절의 순환이 생겨나고 그게 바로 자연순환의 모습이다.
어제는 壬寅(임인)이란 간지가 한꺼번에 왔던 날이고 오늘은 雨水(우수). 양기를 북돋기 위해선 일단 청소부터 시작해보자. 물건을 치우다 보면 마음도 치워져서 깔끔해지니 말이다.
'자연순환운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상 러시아의 패배 (0) | 2022.02.28 |
|---|---|
| 하나의 假說(가설), 神(신)과 절대, 과학과 자연운명학과 관련하여. #4. (0) | 2022.02.21 |
|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상에서 가장 쿨(cool)했던 사나이 (0) | 2022.02.17 |
| 봄이란 먼저 비우고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때 (0) | 2022.02.06 |
| 360년 週期(주기) 또는 흐름에 대해 (0)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