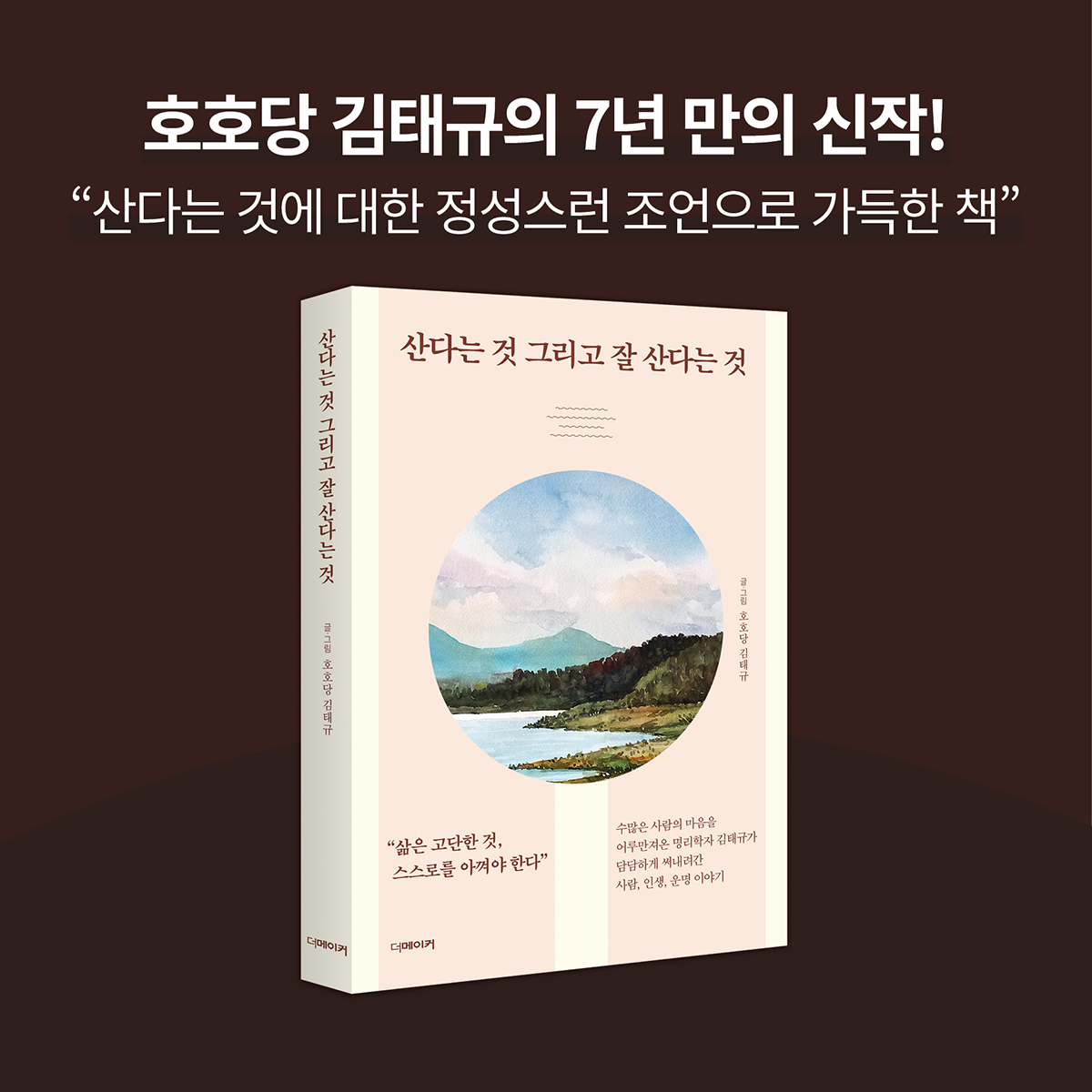자연과 우주는 가장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자연의 현상, 예로서 기상의 변화는 워낙 복잡다단해서 일기예보는 툭 하면 틀린다.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변화 또한 실로 복잡해서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더해서 우리가 속해있는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현상의 바탕에 놓인 다양한 변수들과 그 변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언젠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또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해가고 있다.
그런 과학자들에게 있어 커다란 의지처 또는 낙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 최소작용의 원리란 것이 그것이다.
최소작용의 원리
영어로는 Principle of least action.
자연계는 물론이고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의 모든 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움직인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어쩌면 하나의 믿음이자 信念(신념)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원칙이 확립되기까지 거의 여러 천년에 걸친 많은 연구와 가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왔다. 그걸 이 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기엔 분량도 그렇고 아울러 수학의 이론들을 동원해야 하기에 설명을 생략한다.
그저 최소작용의 원리를 알아낸 이는 19세기의 윌리엄 해밀턴이란 천재 수학자이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탕에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페르마도 있고 또 다른 천재수학자들인 오일러와 라그랑주가 다듬어놓은 방정식이 있다. (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들이 간혹 나오기 마련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빛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날아갈 때 직선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보면 빛이 휘어져가기도 한다. 왜 빛이 휘는 거지? 하겠지만 휘어지고 굽어져가는 것이 알고 보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쉬운 예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역시 굴절을 일으키는데 그 역시 가장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시간의 원리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더 발전해서 최소작용의 원리로 정립되었다.
재미난 점은 이 원리의 오랜 버전은 AD 1세기 그리스의 공학자였던 헤론이란 사람이 빛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날아갈 때 최단거리로 움직인다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최단거리가 최소시간일 것이니 자명해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휘어진다. 그렇기에 최단거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휘어지는 것이 최소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인 것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천재 수학자 페르마가 알아내었다는 사실이다.
굽어지고 돌아올지언정 그게 더 빠르다. 신기하지 않은가!
더 신기한 것은 자연이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택한다는 사실이다. 자연이 어떤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많은 경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경로를 연산해낸다는 말이 되니 더더욱 신기해진다.
최소작용의 원리와 현대우주물리학
이처럼 얼핏 이상하고 신기하게 들릴 수도 있는 최소작용의 원리는 전자기학이라든가 일반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에 적용되었고 그를 통해 근현대 과학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하나 들겠다. 현대 우주물리학은 빅뱅으로 해서 생겨난 우주가 현재 138억 년이 되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현대 우주물리학자들은 빅뱅, 즉 우주가 처음 시작된 직후의 첫 1조분의 1조분의 1조분의 1조분의 1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지극히 짧은 시간이 흐른 뒤의 3분 동안에 생겨난 일은 대단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
1조분의 1조분의 1조분의 1조분의 1초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10의 32승 분의 1초를 말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미세한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하니 불교 용어인 刹那(찰나)가 떠오른다. 찰나란 시간의 길이는 대략 0.013초를 뜻하는데 이게 고대인들에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의 길이였다. 물론 지금도 극히 짧은 시간이다. 아마도 찰나란 시간의 길이는 우리 인간이 그 시간 동안에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닐까 싶다. 일종의 반응속도라 할까.
불교에선 刹那三世(찰나삼세)란 개념도 사용한다. 현재의 찰나를 현세(現世)로 하고 그 앞뒤의 찰나를 각각 과거세(過去世)와 미래세(未來世)로 하는 삼세의 개념이다. 모든 것이 1찰나 전에 생겨나서 지금 찰나에 사라지고 다시 1찰나 뒤엔 다른 무엇이 생겨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선 1 찰나 정도의 시간을 마치 대단히 긴 시간인양 다루고 있다. 찰나란 시간의 길이는 우주물리학자들이 다루는 빅뱅 이후 10의 32승 분의 1초란 시간의 길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장구한 세월이니 말이다.
다시 돌아와서 얘기이다. 우주물리학자들은 빅뱅 이후 10의 32승 분의 1초 이후 3분까지 벌어진 현상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빅뱅 이후 10의 32승 분의 1초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에 어쩌면 그 지극히 짧은 시간의 영역이야말로 수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값(또는 절대값)과 극한 또는 극한값을 나누는 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목표를 수행하고자 할 때 흔히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지? 우리 역시 자연처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인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빠른 코스에 대해 앞서와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직선 코스를 찾는다. 보통의 우리들은 최소거리와 최소시간을 사실상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보통의 인간에게 있어 거리와 시간은 구분이 되질 않는다고 얘기해야 맞을 것이다. 그게 그거지 뭐!
흔히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표현을 쓴다.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길로 느끼는 까닭이다. 시간과 거리가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들은 거기까지의 직선 코스, 또는 질러가는 길이 무엇이냐 묻곤 한다. 영어론 shortcut!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성미가 급하고 질러가길 좋아하는 빛이란 놈도 때론 가장 빨리 가기 위해 휘어져간다는 사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그렇다. 이 대목에서 유명한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서인 孫子兵法(손자병법) 속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先知迂直之計者勝(선지우직지계자승), 此軍爭之法也(차군쟁지법야).
“우선은 돌아가는 계책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 이는 전투의 방법이다.”
물론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본다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선결요건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일 수 있을 것이고 때론 목표지점을 점령하기 위해 저항이 적은 지점을 돌아서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경우마다 최적 경로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 역시 최소시간의 원리이자 결국 최소작용의 원리를 설파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자병법은 역시 대단한 책임을 확인한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자연마저도 최적경로를 찾아내건만 우리 대부분은 최단거리와 최소시간마저 구분하지 못한다. 때론 돌아갈 줄 알아야 빨리 간다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바보만이 욕망에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둡다. 순순하게 받아들이자!
絶對(절대)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의 얘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絶對(절대)란 것에 대해 얘기해본다. 흔히 神(신)을 絶對者(절대자)라고 부른다. 절대의 존재란 뜻이다. 그렇다면 절대란 무엇일까?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견주거나 비교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다시 극한(limit)이 연상된다.
극한(limit)이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絶對(절대)란 것 역시 우리가 무한히 근접해갈 순 있어도 끝내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거리와 시간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절대의 또 다른 이름인 神(신)에 대해 그 존재가 무엇이고 어떻다는 둥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이다.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우리 인간처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참고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1927년에 낸 “존재와 시간”이란 책을 통해 “존재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캐묻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神(신) 또는 절대자에 대해 어떤 무엇으로든 판별하려 들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절대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敬畏(경외)의 마음이라 본다.
절대의 영역을 우리가 상정해볼 순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영역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최대치는 그 값에 무한히 근접해가는 값 즉 극한값(limit)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다.
'자연순환운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겨울은 죽음의 계절 (0) | 2021.11.24 |
|---|---|
| 종교인의 삶과 운명 (0) | 2021.11.04 |
| 세상이 커질수록 나만 작아지나니 (0) | 2021.10.23 |
| 하나의 假說(가설), 神(신)과 절대, 수학과 자연운명학과 관련하여. #2. (0) | 2021.10.13 |
| 하나의 假說(가설), 神(신)과 절대, 수학과 자연운명학과 관련하여. #1. (0) | 2021.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