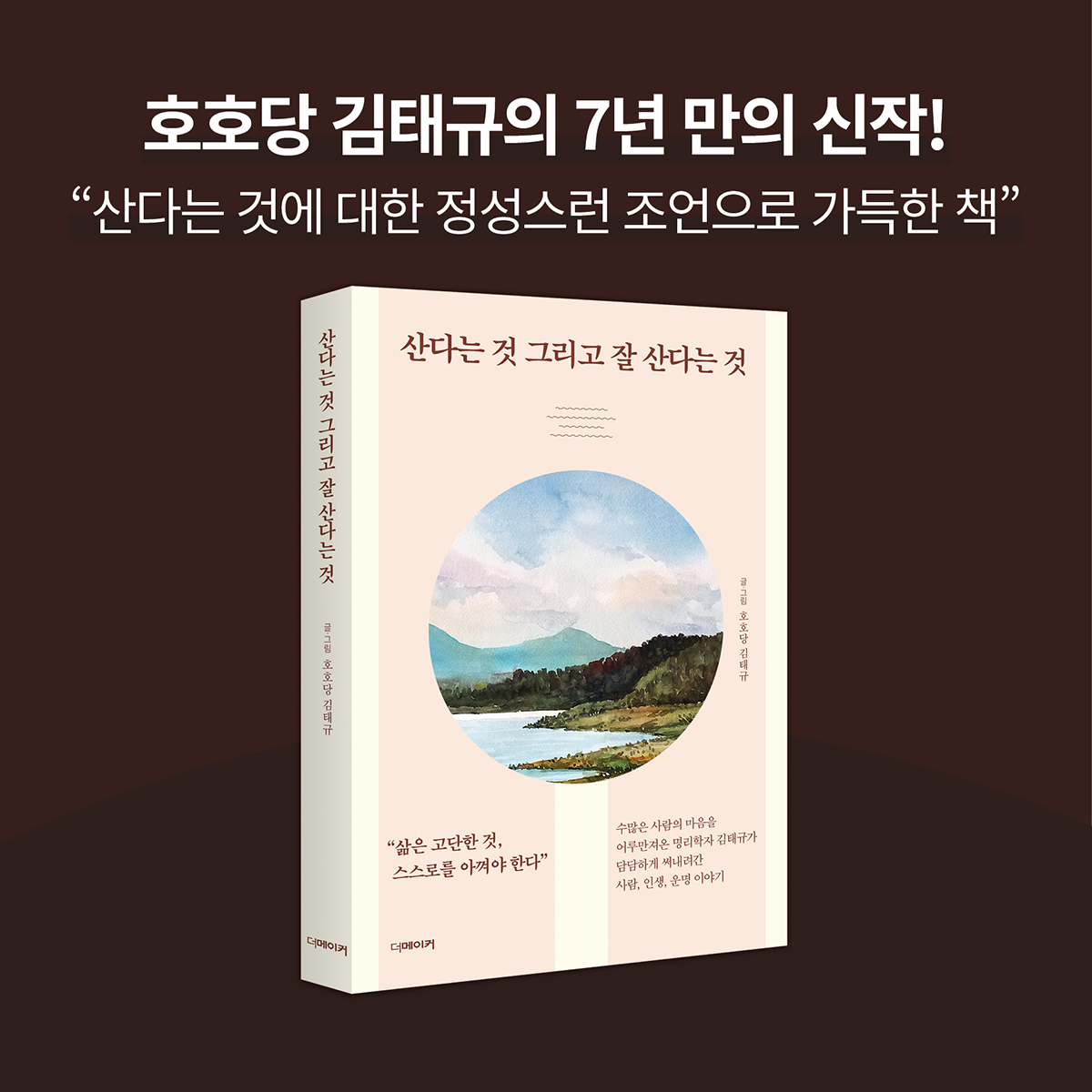우리의 지구는 우주 속을 초당 30 킬로미터씩이나 날아간다.
오늘은 冬至(동지), 해가 가장 짧은 날. 정확한 시각은 오늘 22일 오후 1시 19분 26초였다.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1년이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의 길이는 9억4천만 킬로미터, 그런 멀고 먼 길을 지구는 하루에 평균 258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 대단히 빠른 속도, 초로 계산하면 1초에 30킬로미터의 우주 허공을 날아간다. 음속의 88배, 무지막지한 속도이다.
그런 지구가 오늘 오후 1시 19분 26초에 공전궤도상의 冬至點(동지점)을 통과했다. 지금 시각이 오후 4시 41분이니 동지시각으로부터 3시간 23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벌써 지구는 동지점으로부터 36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날아가고 있다.
오늘 동지의 일몰시각은 서울의 경우 오후 5시 17분, 그러니 이제 다시 해가 서서히 조금씩 길어져갈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그레고리력을 사실상 세계 표준 달력으로 채택하면서 양력의 1월 1일을 새 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양력 1월 1일은 그야말로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너저분한 달력이다. 정말이다. 오로지 많이 쓰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최강국 대영제국에 이어 오늘날의 글로벌 최강국 미국이 채택하고 있기에 편의상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다.
세 번에 걸친 새해 첫날
이에 오늘은 가장 합리적인 견지이자 나 호호당이 연구해낸 자연순환의 이치에 근거하여 새해의 기준에 대해 일단 얘기해볼 까 한다. 오늘의 얘기는 자연순환운명학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다.
天地人(천지인) 三才(삼재)의 기준이다.
冬至(동지)는 하늘의 새해 첫날이고 내년 1월 20일의 大寒(대한)으로서 땅의 새해 첫날이 되며 이어서 내년 2월 19일의 雨水(우수)로서 사람의 새해 첫날이 된다.
세 번에 걸친 새해 첫날이 있다는 얘기이다.
동지가 하늘의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은 오늘로서 빛이 다시 길어지는 까닭이고, 1월 20일 경의 大寒(대한)이 땅의 첫날이 되는 것은 그 날로서 얼었던 땅의 온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까닭이며, 雨水(우수)가 사람과 모든 생명의 첫날이 되는 것은 그 날로서 땅속의 얼었던 물이 위로 올라와 허공으로 증발해가는 까닭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물이 없인 살지 못한다. 이에 땅속의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첫날인 雨水(우수)로부터 생명의 약동이 시작되니 그를 생명의 첫날이라 하는 것이다.
해마다 2월 20일경의 우수가 되면 겨울잠에 들었던 동물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나무들도 밑동에서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한다. 사람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겨우내 ‘슬립 모드’에 들어가 있던 우리의 몸 전체가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다. 생리의 리듬이 다시 빨라지고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
(봄철 나른해지는 춘곤증이란 증세가 있다. 그 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슬립 모드에 들어가 있던 우리 몸이 우수를 맞이하여 기초 대사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피로를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
동지로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얼어만 가던 땅이 다시 데워지기 시작한다. 바로 대한이다. 땅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한 달이 지나면 드디어 땅속에서 얼음 형태로 존재하던 물이 해빙되기 시작한다. 우수인 것이고 그로부터 생명이 꿈틀거린다.
天地人(천지인) 三才(삼재)에 따른 새해 첫 날
빛은 하늘로부터 오기에 동지로부터 하늘의 첫날이라 하는 것이고 열은 땅이 데워지면서 시작되기에 대한을 땅의 첫날이라 한다. 다시 땅속의 물이 녹으면서 그 물이 오르고 증발하게 되니 생명이 약동한다. 이에 우수를 사람의 첫날이라 한다. 天地人(천지인)의 원리이다.
천지인을 달리 표현하면 빛과 熱(열)과 濕(습)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에 한 해의 운행을 살펴볼 때 빛이 열로 전환되기까진 1달이 걸리고 열이 다시 얼음을 녹여 습기로 전환되려면 다시 1달이 걸린다. 時差(시차)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時差(시차)
60년의 순환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는 한 해의 운행과 정확하게 동일하다. 자연은 같은 것을 다른 시간 주기에 맞추어 고스란히 반복 재생한다는 한다는 말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60년에 걸쳐서도 동일하게 전개된다는 말이다. (순환의 동형 반복 원리라 하겠는데 이 또한 자연순환운명학의 중추적인 이론이다.)
앞에서 빛과 열과 습이 움직이는 것은 1년에 걸쳐 각각 1달의 시차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60년의 순환에 대입해보면 각각 5년의 시차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빛에서 열을 거쳐 물의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10년의 시차가 있다는 말도 된다.
그렇기에 오늘의 일이 원인이 되어 10년 후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의 일은 10년 전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를 나 호호당은 “10년의 因果(인과)”라 말하기도 하고 “10년의 法則(법칙)”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고 사람의 모든 일이 그렇다. 10년의 법칙이 존재한다.
예컨대 오늘 당신이 오랜 노력 끝에 어떤 일에서 성취를 보았다면 그 시작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의 결실이라 봐도 된다. 반대로 당신이 오늘 크게 난처한 경지에 몰렸다면 그 또한 10년 전에 그 원인이 존재했다고 보면 정확하다는 말이다.
因果(인과)를 통해 맞물리는 6개의 사슬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결과는 또 다시 10년 뒤에 있을 결과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결과로 변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꼬리를 물면서 세상과 사람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사슬을 만들어낸다.
이를 60년의 순환에서 보면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인과의 사슬이 만들어져간다. 즉 6개의 과정이 因果(인과)를 이루면서 사슬을 만들어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소 추상적인 얘기라서 좀 더 쉽게 가장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1년을 6개의 과정으로 나누어보면 농부가 볍씨를 뿌리는 때는 4월 하순의 때가 된다. 이에 볍씨가 땅껍질을 뚫고 나와서 6월 하순이 되면 벼가 거의 다 자란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볍씨를 뿌린 것이 원인이고 거의 다 자란 벼는 결과가 된다.
거의 다 자란 벼는 뜨거운 땅의 열기와 물을 이용해서 8월 하순이면 쌀이 되는 이삭이 매달린다. 벼의 성장은 끝이 나고 자손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 자란 벼가 원인이고 이삭이 결과인 셈이다.
8월 하순에 생겨난 이삭은 한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를 이용해서 10월 하순이 되면 아주 굵은 쌀알이 된다. 이삭이 원인이고 다 익어 실해진 쌀알이 결과가 된다.
그러면 10월 하순부터 추수가 시작되어 곳간으로 들어가 저장되거나 시장에 내다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빚이 있으면 갚게 되고 그러고도 남는 쌀은 겨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먹게 될 곡식이 된다. 그러면 12월 20일 경의 동지이다. 秋收(추수)가 원인이고 곳간에 쌓인 쌀이나 통장에 입금된 돈은 결과가 된다.
12월 하순부터는 농한기라서 가을 수확이 푸짐했던 농가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일손을 놓고 소비를 하게 되니 다음 해의 2월 20일 경의 雨水(우수)까지이다. 푸짐한 수확이 원인이고 한가로운 생활이 결과가 된다.
그런데 2월 20일경의 우수가 되면 쌀독의 쌀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니 은근히 걱정이 생겨난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또는 어쩔 수 없이 논도 갈고 밭고 갈게 된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4월 하순에 가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볍씨를 뿌리게 되니 그 역시 결과가 된다.
벼농사는 이것의 끊임없는 연속이고 반복이다. 한 해를 통해 두 달 단위로 인과를 이루면서 변화해간다.
글이 다소 길어질 것 같으니 오늘 글은 이 정도에서 쉬어가기로 한다.
다음 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60년에 걸친 순환의 내용은 물론이고 사람의 일 즉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오늘의 논리를 활용해서 설명해볼 생각이다.
해가 떠있던 오후 무렵 시작한 글을 멈추었다가 늦은 밤이 되자 다시 시작했다. 지금 시각은 23일 새벽 1시 30분, 동지점을 떠나온 지 벌써 12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삶의 시간이 12시간 더 짧아진 것이고 그만큼의 미세한 노화 과정이 더 진행된 셈이다.
인생이 달리 무엇이겠는가, 지금처럼 내 눈앞을 흘러가는 시간들의 집합인 것이니 말이다. 12월 22일의 동짓날을 살았고 이제 23일의 새날을 살기 시작했다.
(이번 자연순환운명학 강좌는 연말 분위기라 그런지 수강 신청에 아직 여유가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의 신청이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연순환운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년 새해에 (0) | 2020.01.03 |
|---|---|
| 내용 없는 풍요로움의 사회 (0) | 2019.12.26 |
| 증권투자기법에 관한 연말 특별강좌 (0) | 2019.12.18 |
| 첩첩산중 오리무중의 대한민국 (0) | 2019.12.16 |
| 허무하게 끝이 난 비핵화 협상 (0) |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