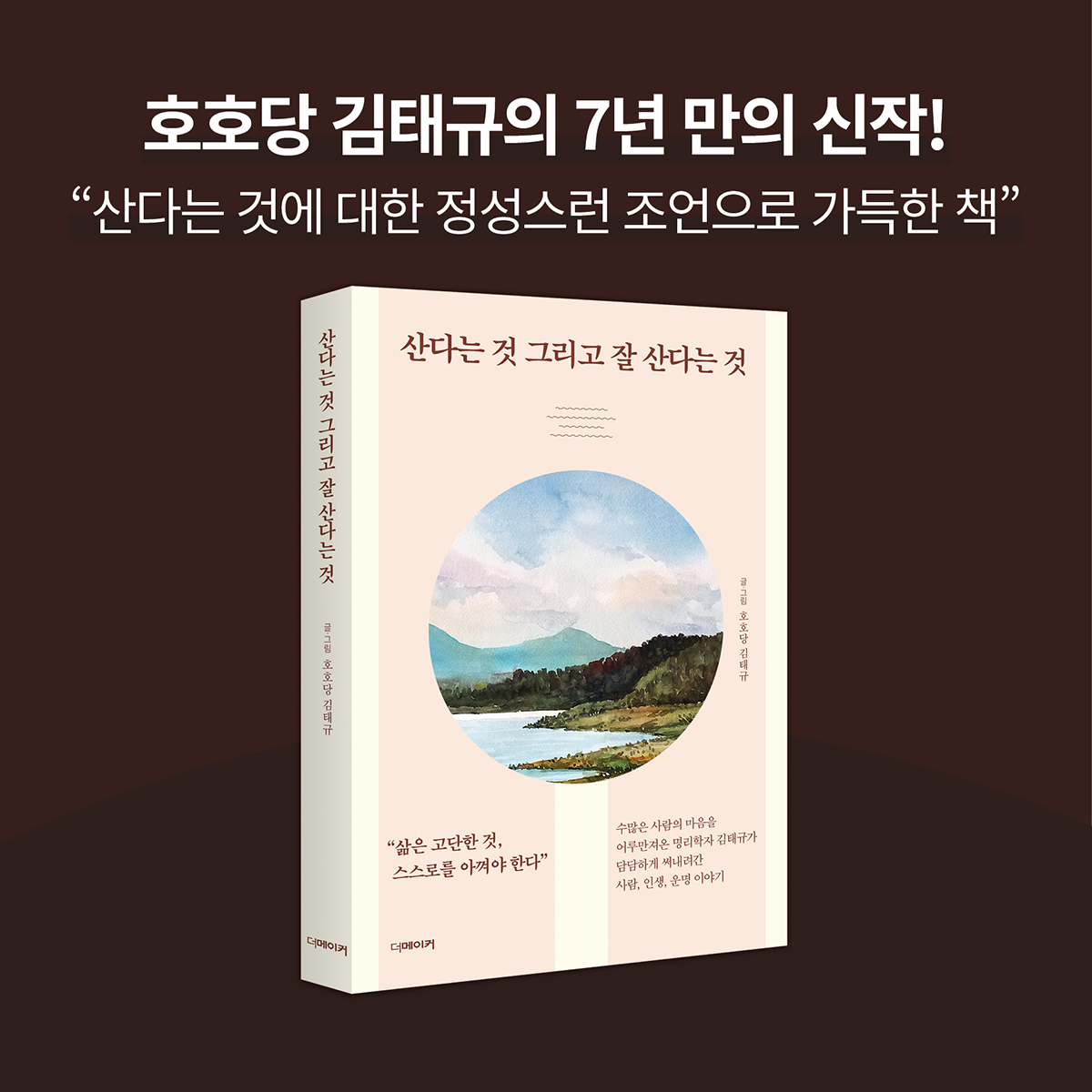강원도 어느 산사 마당에 핀 홍매화
2003년 어느 봄날이었다. 강원도의 작은 암자에 가서 하루를 묵었다. 어쩌다 인연이 되어 바둑 친구가 된 스님이 그 암자에 계시는 바람에 2001년 봄, 그리고 2002년 봄에도 그 암자를 찾아서 두어 밤을 보냈었다.
밤새 바둑을 두었기에 새벽 무렵 잠이 들었다가 대낮이 되어서야 깨어난 터였다. 멍을 때리면서 무심히 바깥을 내다보았다.
요사채 앞마당에 홍매화 한 그루가 있었는데 우연히도 연이어 개화 시기였던 모양이다. 그냥 방안에서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 매화를 보려는 것도 아니었다. 밖을 내다보는데 마침 그곳에 매화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고 그러면서 매화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해가건만 매화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창 만개하고 있었다. 마치 작년 재작년의 그 매화꽃 같아 보였다. 처음엔 그저 봄이 되어 다시 피어난 꽃일 뿐이라 했는데 그 꽃들이 내게 “아냐, 난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하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혼자 슬쩍 웃으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다.
꽃이란 게 사실 오래 피어있지도 않는다, 만개했다가 시시각각 시들어간다. 그런대 그런 저 꽃들을 다른 꽃이라 해도 되겠으나 같은 놈이라 해도 말이 되네 싶었다.
늘 떠나가지만 늘 되돌아온다면
모든 게 無常(무상)해서 늘 변해간다고 하지만 달리 보면 늘 같은 모습이니 有常(유상)이라 해도 되네, 새롭게 피어난 꽃이 분명하건만 실은 같은 행위를 늘 반복하고 있잖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같은 거잖아, 즉 常(상)하다 해도 될 것 같았다.
늘 떠나가지만 늘 되돌아온다, 거 참 이상하네, 신기하네, 그 생각에 매달려 하염없이 그 매화꽃을 바라보았다,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시간이란 게 화살처럼 한 번 쏘고 나면 핑-하고 날아가서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보통의 관념인데 나는 그 순간 시간이란 게 순환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 더 마음이 갔다.
시간이란 사물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툴(tool)이다. 그런데 변화하면서도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면 시간을 순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때에 이르면 해마다 늙어간다, 하지만 그건 몸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일 뿐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가 고물이 되는 건 많이 달려서 그렇지 시간이 가서 그런 것도 아니듯 말이다.
자연순환운명학의 시작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 호호당의 오랜 연구 과제였던 “자연순환운명학”이 胎動(태동)하고 있었다.
가만 있어봐, 지구상의 대표적인 순환의 숫자는 60 이다. 고대 바빌론의 60진법, 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날자, 즉 365일과 나머지 지저분한 숫자들에서 왔다. 옛 사람들도 1년이 365.2425... 으로 이어지는 무한소수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냥 깔끔하고 아름답게 360으로 정리했다.
황도대의 태양이 하루에 1도씩 움직여서 1년이면 360도를 움직여서 제 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다. (거 봐라 돌아온다고 하지 않는가!) 시간은 돌아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360을 60이 여섯 번 이어지는 숫자로 한 것이 바로 60 進法(진법)이다. 그 60 진법을 가져다 중국에서 만든 것이 甲子(갑자) 乙丑(을축), 으로 이어지는 60갑자인 것이고.
지금도 시간 단위는 여전히 60 진법을 쓰고 있다. 한 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60을 나누어서 12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루는 24시간, 중국에선 12시진, 그런가 하면 1971년까지 영국의 1파운드는 12 실링이었다.
"시간의 화살"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시간을 쏘아진 화살로 보는 관념은 내가 알기로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경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그 양반이다. 한 번 쏘아져서 멀리 날아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슬프게도 한다.
연인과 데이트하고 나서 헤어질 때 괜히 또 봐, 이런 말을 하겠는가! 되돌아온다는 말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See you again, 짜이찌엔(再見), 우리 다시 만나요, 잘 가고 또 봐, 등등.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을 直線(직선)으로 파악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한 것은 신학 敎理(교리) 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겠으나 나중에 근대 이후 과학이란 놈이 위세를 떨치면서 그런 식으로 대못을 박으면서 아주 그렇게 확정되고 말았다.
안 그래도 인생 한 번 살다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게 싫어서 여러 문화권에선 輪回(윤회)와 轉生(전생)을 더 믿었던 것이다. 기독교 또한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긴 하지만 신앙을 잘 가지면 죽어서 알 수 없는 으슥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다고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오늘날 사실상 무신론 또는 회의주의가 더 우세한 시대란 점을 감안하면 “시간의 화살”이란 관념은 아주 고약하다. 공주를 많이 한 스님일수록 윤회와 전생을 잘 믿지 않는 눈치이고 목사님들도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란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더욱 더 그렇다. 우리를 불안케 한다.
이런 얘긴 그만하고 아무튼 2003년 어느 봄날 산사에서 나는 자연순환학의 기초 개념을 세울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
자연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몸으로 느껴보니
산사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60년을 한 해 열 두 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5년은 한 달이 된다. 그리고 한 해 12개월의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으로서 사람의 운명을 설명해보자, 이게 토대가 되었다.
그 이후 나는 한 해의 순환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 움직이고 변화해간다.
그 바람에 24 節氣(절기), 즉 각 절기마다 나타나는 변화와 현상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했다. 나중엔 다시 72候(후), 즉 5일마다의 변화도 체감할 수 있었다.
변화해가지만 다시 되돌아온다, 반복하면서 변화해간다.
이젠 나름 도가 통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이제 나는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또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보지 않아도 直感(직감)한다. 거의 틀림이 없다. 모습과 자세, 목소리, 차림, 말과 행동을 통해 고스란히 다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장 부유한 때는 그 사람 운의 60년 순환에 있어 立冬(입동) 무렵이다. 자신감과 함께 여유도 부리면서 약간은 교만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재미난 세월은 다 보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면 꽤나 실망하겠지.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눈빛이 형형하고 도전적이면 이제 夏至(하지), 즉 6월 22일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룬 건 없지만 벌써 여러 번의 큰 싸움을 치르면서 체화된 전투력이 있어 보이면 8월 하순의 모습, 處暑(처서)인 사람이다.
가장 아름다운 절기는 소만이라네
그런데 사람이 나 호호당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때가 따로 있으니 바로 5월 20일 경의 小滿(소만)이다.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겸손하고 가식이 전혀 없다. 위선이나 자신감도 없다, 그저 말갛다. 그리고 푸릇푸릇하다.
운세가 소만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때도 끼지 않았고 화려함도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의 본 면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미모를 떠나서 그 아름다움에 늘 탄복한다.
5월 하순의 밤공기를 생각해보라. 그 무렵이면 밤에도 寒氣(한기)가 없다. 자켓을 벗고 걸어도 전혀 춥지 않다, 셔츠 소매를 걷을 것 같으면 사랑스런 밤공기가 살을 어루만진다. 바람도 부드러운 微風(미풍)이다. 낮으로 시간을 내어 바깥에 나가면 화창한 초여름의 신록이 상큼하다. 그리고 문득 뻐꾸기 우는 소리도 들린다. 모든 게 사랑스럽다.
5월 하순의 그 모든 싱그러움이 60년 순환의 소만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선 체취로서 동작으로서 그리고 목소리 속에서 느껴진다. 당장은 어떤 미래도 있어 보이지 않지만 실은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가진 게 없기에 가능성은 無限(무한)의 영역이다, 그 무한한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설레게 한다.
이건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소만의 운인 사람에게선 모두 그렇다. 몇 년 전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상담을 왔다 갔는데 운세가 소만이었다. 몸은 늙어서 볼품이 없었지만 눈빛은 5월 하순이었다. 지병이 있어서 스스로 얼마 살 지 못한다고 토로하시면서 지나온 삶이 무척 힘들었다는 말쓴도 하셨다. 하지만 달리 어떤 恨(한)이나 바람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 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고 있었다.
속으로 이 분은 앞으로 5년 정도 더 사시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다. 아마도 그 정도 사셨을 것이라 본다. 다만 확실하게 자신하는 것은 그 분은 죽음으로의 과정이 아주 수월했을 것이란 점이다. (죽을 때 고생하는 것도 역시 운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운이 아니라 삶의 생체적인 순환, 즉 신체적인 나이로 치면 21살 무렵이 5월 하순, 즉 小滿(소만)이 된다. 21살의 젊은이, 얼마나 싱그러운가! 그에 비하면 나 호호당은 67년을 더 살았으니 이제 한 겨울로 들어서고 있다. 약간 슬프다.
재밌지 않은가? 21살 청년의 모습을 50이 넘은 사람일지라도 운세가 소만일 경우 그 청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물론 그게 육체적인 젊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나 태도이지만 말이다.
초봄에 5월 하순의 情景(정경)을 그리게 되니
그러고 보니 이제 초봄이다, 오는 19일 일요일이 雨水(우수), 쌀쌀한 초봄의 바람이 실어오는 들녘의 쑥과 냉이의 향을 상상해보면 좋겠다.
나 호호당은 몸으로선 이미 46년 전에 5월 하순의 小滿(소만)을 아무 것도 모르고 흘려보냈다. 그렇지만 이제 석 달만 지나면 5월 20일의 소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소매를 걷고 초여름 밤공기 그리고 소프트한 바람에 몸을 맡겨볼 생각이다. 늘 변화해가지만 늘 되돌아오는 순환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또 상상해본다, 80 중반의 늙은 호호당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5월 하순의 들녘을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해본다. 그냥 그 초여름의 들판에서 어쩌다가 쓰러져 삶을 마칠 수만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늘 변화해가지만 늘 다시 반복되듯이.
'자연순환운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閉關修練(폐관수련)을 마치고 (0) | 2023.03.19 |
|---|---|
| 時節(시절)을 알아야만 (0) | 2023.02.27 |
| 우리 국운 제3기를 앞두고 (0) | 2023.02.08 |
|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아 글쎄?) (0) | 2023.01.29 |
| 코로나는 가셨는데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