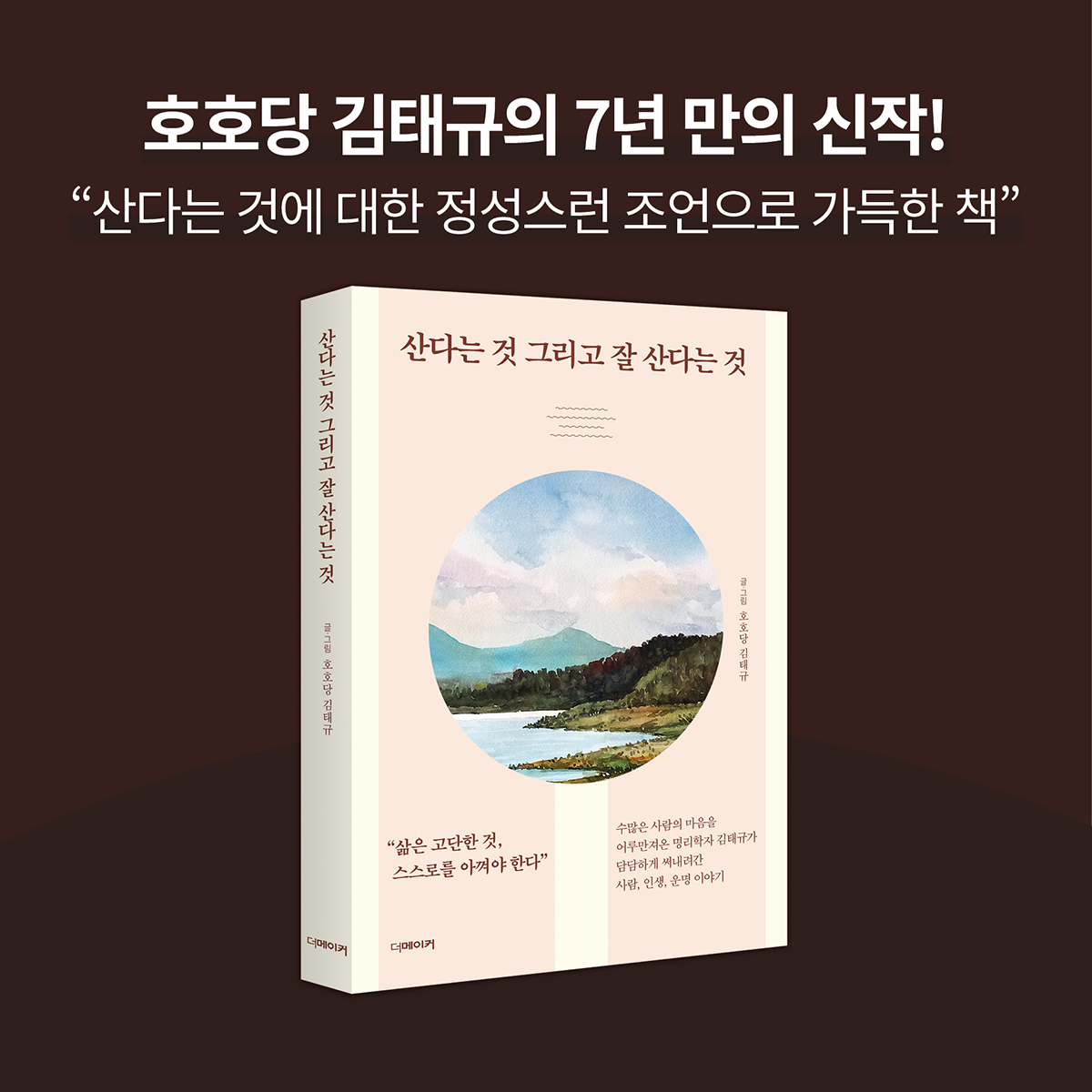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AD 1세기부터였지만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중국 당나라 시절의 현장 스님을 전후로 해서 나뉜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모셨던 그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그 현장 스님 말이다.
그 답답한 친구 현장 스님 이전의 번역된 불경을 舊譯(구역), 즉 옛날 식 번역이라 하고 현장 스님부터 번역된 불경을 新譯(신역)이라 할 정도로 크게 나뉜다. 7세기 중반이다.
불교 철학은 중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중국 지배계급과 지식인층에게. 그때까지의 중국 철학에 비해 불교 철학은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사변적이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세련되고 있어 보였다. 음메 기죽어!
이에 자칫 외래문물이 중국 철학과 지식 시장을 다 차지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날로 커지자 중국 지식인들 또한 대응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나라 시절의 韓愈(한유)이다. 唐(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로서 이른바 唐宋八大家(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그 한유 말이다. 그는 우리에게도 불교에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문장과 사상이 있다면서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것이 더 좋다는 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인도의 불교가 뛰어났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아무튼 중국 지식인들은 불교 철학을 흡수하고 그를 활용해서 중국식의 대항 논리와 철학 체계를 만들어내었으니 이게 바로 새로운 유학 즉 新儒學(신유학)이다. 이를 국내에선 주로 성리학이라 부른다.
신유학은 정씨 형제와 주돈이 등을 거치면서 나중에 朱子(주자)에 의해 집대성되었는데 이 대목에서 理氣(이기)에 관한 학설이 성립되었다.
이제 중국 지식인들 또한 세련된 철학, 엄청 있어 보이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나 호호당 또한 궁리하기 좋아하고 지적 허영심도 많아서 젊은 시절부터 불교철학과 성리학, 서구의 관념철학 등등 두루 섭렵해보았지만 나이 70이 되니 그게 다 쓰잘데기, 즉 쓰잘마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뭘 어쩌자는 건지, 원래 인문학적 지식이란 게 다 그렇다.
그러자 운명술도 바뀌어야 했다. 원래 문자를 좀 쓰는 직업인지라 고객들도 문자를 알고 쓰는 지식인이나 지배계급이었기에 그랬다. 이제 더 이상 神煞(신살)로 보는 법은 잘 먹히지가 않았다.
그래서 운명술 또한 命理學(명리학)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유학 즉 性理學(성리학)이란 말에 대응하는 의미였다.
타고난 성품을 性(성)이라 한다면 그것의 이치를 따지는 것이 性理學(성리학)이다. 그런데 그런 성을 부여한 것은 하늘일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 명령했다는 의미에서 命理學(명리학)이 된 것이다.
내용 또한 성리학의 수준에 맞추어 세련되고 격조가 있어야 했기에 조잡한 神煞(신살)법은 지식인 계층에게 인기가 팍-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神煞(신살)을 위주로 하는 古法(고법)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운명학의 소비 시장이 나뉘었다. 지배계층과 문인 지식층을 대상으로 고상한 말과 현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새로운 명리학과 일반 평민을 대상으로 간단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古法(고법)으로 나뉜 것이다.
오늘날에도 唐四柱(당사주)라고 해서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 음력생일만 알면 누구나 금방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실은 神殺(신살)을 위주로 하는 古法(고법)에서 겁주는 말을 대폭 덜어내고 좋은 말을 듬뿍 넣어서 대중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채를 듬뿍 낼 수 있는 지배계층과 그 지배계층에게 영향력이 큰 문인 지식층에겐 理氣(이기)와 같이 좀 더 현학적인 단어를 써가며 운명을 에측하고 풀이하는 새로운 명리가 주류로 등장했다.
그러면 다음 글에선 새로운 명리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자연순환운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명학 그리고 나 호호당 #6 (0) | 2025.01.30 |
|---|---|
| 운명학 그리고 나 호호당 #5 (0) | 2025.01.29 |
| 운명학 그리고 나 호호당 #3 (0) | 2025.01.28 |
| 운명학 그리고 나 호호당 #2 (0) | 2025.01.28 |
| 운명학 그리고 나 호호당 #1 (0) | 2025.01.27 |